한국: 특히 여성이 자녀의 가치를 수용 않고 불필요하게 여김.
일본: 자녀의 가치를 대부분 수용하며 젊은 여성 사이에서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추이.
한국은 젊은 여성 절대다수가 자녀(출산) 비선호.
일본은 젊은 여성 절대다수가 자녀(출산) 선호.
분업지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는 가치관
가정우선: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엔 전통적 성 역할 규범 지지
이중부담: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에 크게 반발하나 '어머니가 취업하면 자녀와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도 강한 찬성의견
평등: '어머니 취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여성이 일을 해도 자녀와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는다'
보다시피 한국의 젊은 세대일수록 이중부담 내지는 평등이 압도적이고, 여성의 가정성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임.
[특이점]
한국은 보수적 집단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에 찬성률이 높다.
'한국에서는 여성의 취업 성격이 M자형을 그리기에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데도 한국에서는 어떤 유형에서든 여성의 경제적인 기여에 대해 높게 요구되는 점이 확인된다.'

일본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서도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고 있으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에서 찬성의견이 낮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총합적인 응답 패턴으로 봤을 때 가장 평등지향적인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에서 전업주부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Q1E). 이 집단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남녀 역할분업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게 반대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과 큰 차이 없이 찬성의견이 낮고 전업주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 여성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가구소득 기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일본형 평등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한국 사람도 여성의 가구소득 기여책임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에 비해 일본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도 여성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어떤 유형에서도 여성의 높은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어떤 유형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책임의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 점은 Q1D의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분업지지’ 지향 유형에서는 점수가 아주 낮지만 ‘평등’ 지향 유형에서는 점수가 아주 높아 ‘분업지지’와 ‘평등’ 유형 사이에 큰 가치 규범 차이가 존재하지만 ‘평등’ 지향에 있는 집단에서는 여성의 행복을 가족과 자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Q1D).
한국의 ‘평등’ 유형은 여성도 남성도 경제활동을 똑같이 수행하고 여성의 역할이 가정 외에도 있다는 점을 공유한다. 그것에 비해 일본은 ‘평등’ 지향에서도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모두 낮은 점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Q1D). 물론 점수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 비해 일본은 진보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에서도 여성의 행복이 가정과 자녀에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가진 ‘전업주부지지-평등’ 지향은 Q1A-Q1C 그리고 Q2B의 점수가 한국의 평등 유형보다 높아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가정이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듯이 일본형 평등 집단은 남녀역할 분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Q1D, Q1E, Q2A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아주 낮은 것으로부터 여성의 행복이 결혼과 자녀 양육에 있다는 가치규범이 한국보다 강하며 여성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정 책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남녀 역할분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가계의 경제책임을 질 생각은 없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가계기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태도임을 이 결과에서 읽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이며 가족주의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만 논의되어 온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 담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던진다. 같은 ‘평등’ 지향이라고 해도 각 사회에서 추구하는 평등의 모습 자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전업주부를 지지하는 형태의 성역할평등을 지지하고 있기에 남녀사이에서 동등하게 역할을 분배하려는 남녀평등은 유형에도 나타나지 않는 소수파이기에 목소리를 내는 전략(voice)은 선택하기 어렵고 결혼을 안하거나(exit) 오히려 자녀양육을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전략(loyalty)이 젊은 여성 사이에서 선택 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가치관의 결과; 일본 여성은 아이를 낳고도 근로를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들은 양육과 병행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를 선호한다
그래서 취업률이 한국보다 높은 만큼 정규직(전일제) 근로 비율은 한국보다 낮게 나타난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국 여성은 가정 외부의 인정에 가치를 두는 성향이 강하기에,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여겨지는 근로 형태가 아닌 것에 대한 기피, 즉, 시간제 근로를 기피하는 성향으로 발현되어 취업률이 낮은 역설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연구자의 원인 추정]
반면 일본에서는 성별 및 코호트로 분석했을 때 한국과 대조적으로 젊은 코호트에서 성역할태도, 결혼가치에 있어 근대가족 지향적인 가치로의 회귀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것은 일본 경제가 침체된 잃어버린 세대의 시작인 1976-1985년 코호트에서 변화의 징후가 보였다가 1986-1995년생 사이에서 더 뚜렷해졌다. 여성을 보면 성역할태도가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에 속하는 여자가 1986-1995년생에서는 50%를 넘었으며 이들 중 자녀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가치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1986-1995년 코호트 여자는 전업주부지향을 강화시켜 자녀가치를 더욱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며 근대가족 지향성이 강화되어 있었다. 이 점이 자녀가치 ‘불필요’ 유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의 같은 세대 여성과 정반대 방향을 향한 매우 대조적인 지향성임이 확인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자유주 노선을 추진한 자민당은 2000년대에 ‘자기책임(自己責任)’론을 내세우고 ‘카치구미(勝 ち 組, winner)’ 와 ’마케구미(負け組、 looser)’ 담론이 등장하자 여성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담론들이 재부상했다.
2003년에 부상된 ‘마케이누(負け犬, 싸움에 진 개)’ 담론은 여자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여론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같은 시기 요리 연구가 쿠리하라 하루미(栗原はるみ) 88 를 중심으로 가정역할에 충실하여 완벽하게 해내는 ‘카리스마 주부’가 다수 미디어에 등장해 여성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전업주부, 모성 담론이 강화되어 갔다. 酒井(사카이, 2003)가 ‘30대 이상, 미혼, 무자녀’는 ‘마케이누’이며 ‘기혼, 유자녀’ 여성은 ‘카치이누(勝ち犬, 싸움에 이긴 개)’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카리스마 주부’는 ‘카치이누’의 상징으로 전업주부는 빛나는 존재로 TV나 잡지에 많이 등장한 시기였다.
이후에 등장하는 ‘혼활’ 붐과 함께 전업주부가 행복한 여성의 상징임을 보여주는 다수의 여성 잡지도 발행되어 있고 전업주부 연구에서 일본의 여성의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예를 들어 Bardsley, 1999; Hardy, 2017; Ishii, 2004; Ishizaki, 2004; 2008; 이시자키(石崎), 2003;).
당시 일본 정치인 또한 저출산 문제를 출산하지 않는 이기적인 여성의 증가로 바라봐 왔다. 2003년 당시 자민당 저출산문제 조사회장이었던 森喜朗(모리 요시로우) 전 수상은 저출산을 둘러싼 검토회에서 무자녀인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을 장래 국가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돌보는 것이 원래 복지 모습인데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여성이 본인 마음대로라고 하면 안될 수도 있지만 자유를 구가(謳歌)하여 즐겼다가 나이를 먹은 후에 세금으로 돌봐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러한 출산을 둘러싼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은 이후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일본에서 오랫동안 정권을 잡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들의 발언은 2000년 이후 상당히 반복되어 왔는데 이러한 발언의 근본에는 ‘여성의 일은 출산, 가사, 육아’라는 공통적인 가치관이 뿌리깊게 내려져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단지 한 정치인의 발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인 집단 속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정신이라고 여겨진다.
사사노 미사에,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 : Family Values i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Gender and Cohort
성별 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2021
[요약]
한국은 팽창사회 속에서 진보파가 스피커를 쥐고 반 가정적 메시지를 송출해온 반면,
일본은 수축사회 속에서 보수파가 스피커를 쥐고 친 가정적 메시지를 송출해왔다는 지적.
이는 곧 한일여성 간의 대조적인 사회문화적 가치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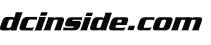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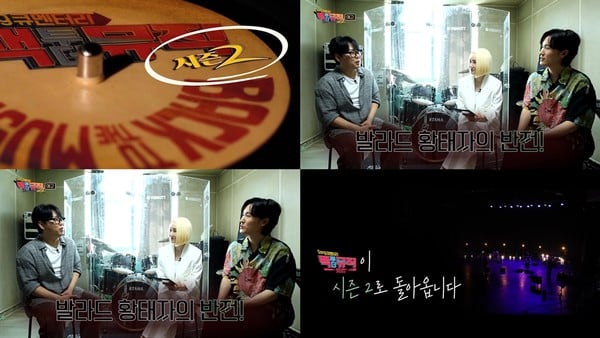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