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3년, 독일 북부에 살던 약사 견습생 프리드리히 제르튀르너(Friedrich Wilhelm Adam Sertürner)는 아편을 연구하고 있었다. 당대 아편은 진통제로 널리 쓰였지만 그 해악성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의약품이 전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였다.
제르튀르너는 아편들의 약효가 죄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느꼈다. 어떤 건 조금만 투여해도 약효가 빨리 돌았지만, 어떤 건 두배 이상 투여해도 약효가 천천히 돌았다. 제르튀르너는 원산지, 제조시기에 따라서 성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아편의 원액만을 추출해서 신뢰할 수 있고 균일한 약효를 내는 합성물을 만들고자 했다.
제르튀르너는 대학교육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들을 토대로 꽤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근무가 끝나면 그는 약국 한구석에 촛불을 켜놓고 조악한 장비들로 아편을 정제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약방에 있는 온갖 약품들로 아편을 녹이거나 침전 시키는 시행착오 끝에, 암모니아를 섞어주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백색의 결정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결정을 '크리스탈'이라고 불렀다.
제르튀르너는 길거리에서 잡아온 떠돌이개와 시궁창쥐에게 크리스탈을 먹여보았다. 약을 투여받은 동물들은 금세 죽은듯이 잠이 들었다가 몇시간 후에 깨어났다. 그는 크리스탈에 수면유도 성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1805년, 제르튀르너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독일 과학계에 투고하였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과학적 과정으로 탄생한 유사과학'이라는 답장이었다. 대학물 먹은 콧대 높은 독일의 과학자들은 제르튀르너에게 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돌팔이 취급했다. 하지만 제르튀르너는 자신의 실험을 계속 이어나갔다.
어느날 밤, 밤샘연구를 하던 제르튀르너는 극심한 치통에 시달렸다. 그는 고통을 줄여볼 생각으로 크리스탈을 조금 집어서 먹어보았다. 그러자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윽고 잠이 쏟아졌다. 몇 시간 뒤에 깨어난 제르튀르너는 인체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어느날 저녁, 그는 자신의 친구 3명을 불러서 시간을 나눠서 크리스탈을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몇시간의 간격을 두고 크리스탈 30mg씩을 총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복용하였는데, 그를 포함한 친구 3명은 모두 동일한 증상을 겪었다.
1차 -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처럼 기분이 좋아짐.
2차 -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무거워짐.
3차 - 정신이 혼란해지고 기절하듯 수면함. 기상 후에는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이 동반됨.
친구들은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제르튀르너는 그 뒤로도 일이 끝나면 집에서 크리스탈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늘리며 실험을 계속했다. 이런 시행착오 끝에 그는 적정 투여량을 15mg으로 규정하였다.

제르튀르너는 아편에서 뽑아낸 이 신기한 백색결정에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강한 수면을 유발한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그리스신화 속의 꿈의 신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따서 모르피움(morphium), 즉 '모르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809년, 제르튀르너는 다시 한번 모르핀에 관한 연구결과를 학회에 투고하였다. 특히 독일말고 프랑스 학회에서는 그의 논문에 큰 관심을 가졌다. 마침내 그의 논문은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1817년 독일 예나 대학은 제르튀르너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했다. 그는 식물 속의 화학성분을 인공적으로 분리해낸 최초의 인간이 됐다. 모르핀은 안정적인 약물로 여겨졌고 아편을 완벽하게 대체하여 의학계에서 널리 쓰이게 됐다. 특히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게 모르핀은 그 어떤 극심함 고통이던 다 잊게 해주는 생명과도 같은 진통제였다.
제르튀르너는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약국을 여러개 운영하면서 생계도 꽤나 넉넉해졌다.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에서는 모르핀 덕분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덜게 해줬다며 그에게 '인류의 은인'이라는 칭호를 수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명예를 얻은 그의 말년은 생각보다 비참했다. 스스로 임상실험을 너무 자주했던 탓에 제르튀르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핀에 중독되어 버렸다. 그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살았다. 그 당시에는 모르핀의 중독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져 있지 않았으므로 잘 조명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모르핀을 혈관에 직접 투여하면 중독증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주사로 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혈관투여는 경구투여보다 더 빠른 약효가 발휘되었고 중독증상 또한 더 심해졌다. 인류가 모르핀의 대체품을 만들어낸 건 거의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였다.
현대의학 발전의 대가로 자신의 몸을 갈아넣은 제르튀르너는 1841년, 모르핀 중독증상에 시달리며 58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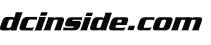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