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높은 언덕의 아파트. 복도는 따스했다. 나는 창에 비친 도시를 봤다. 흔적뿐인 바람. 어스름한 달빛과 흐릿한 가로수. 미세하고도 온전한 빛들의 떨림. 거리를 장식하는 수많은 가게. 상점에 촘촘하게 새겨진 명품. 응결된 갈망이 해동을 외친다. 도시는 불안에 잠겨있다. 자산의 크기로 나뉜 그들의 공간에 인간이 박혀있다. 배분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 욕망의 큰 뭉치가 떠다닌다. 인간. 정신. 물질. 한없이 빈곤한 하루. 답답한 가슴이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물든다.
사건 현장에 발을 디디면 늘 이렇듯 불안감이 도착한다. 속절없이 고통 속으로 끌려들어 간다.
‘젠장 2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낯설다니!’
이불 속에 누운 채, 그는 뻗대고 있다. 단 하나의 느낌이 모든 것을 덮는다. 무상. 징그럽게 길고 이상하게 흐릿한 햇빛이 투과한 정적의 방은, 네모난 공간의 안정감을 갖추기에 너무 많은 장식이 깃들어있다. 조명은 어둡고 눅눅하며 침울하고 벌겋다. 그림자가 가득한 공간. 나는 세움대가 비추는, 바닥에 난 검은 핏자국이 주는 장식에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부산한 집안을 안정시켰다. 코끝이 살짝 비리다.
액자가 사방에 흩어졌다. 조각난 빛들이 시리다. 내 앞에 흐드러지게 펼쳐진 갈등. 흐리고 멍한 여인이 웅크리거나 환한 미소의 흑인 청년이 벽에 처박혀 있다. 통속적인 사진. 액자를 장식한 소품은 더럽다. 아트라고 인쇄된 액자는 그 속이 텅 빈 채 천장만 멍하니 주시하고 있다. 벽시계의 끝이 둥근 초침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진 일상에 못마땅한 듯 투박하게 투덜거렸다.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당연하게도 시간이 맞지 않았다. 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에 늘 혼란을 겪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은 지나치게 정확하고 나 외의 시간은 심하게 느긋했다.
식물이 소파 옆에 놓여있다. 오후의 검은 햇살 아래 속살이 드러난 꽃술. 불쌍하기 짝이 없게 적은 일사량. 주인의 무관심이 주는 몇 방울의 물로 의식을 진정하고 싹을 틔우고 꽃을 벌려 삭막한 사막으로 변형됨을 몸으로 막아서는 고통. 나는 죽은 가지를 톡톡 튕겼다. 공간을 부유하는 빛 속의 먼지. 마스크 속 입김이 뜨겁다.
‘죽은 이는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그는 말할 수 없기에 침묵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마에 박힌 총구멍. 도취한 듯한 눈동자. 옅은 분홍빛 코끝. 나는 그의 이야기를 줍기 위해 애를 쓴다. 굴뚝처럼 솟아오르는 의문.
‘당신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일그러져 있었나? 혹은 강렬하고 지배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혔나? 혹은 자신을?’
벽난로. 내가 못마땅해하는 소품. 자리만 차지하고 볼품없고 그을음을 생성해 기관지를 괴롭히고 따스함이라는 정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안락함을 선사하고 묘한 뒤틀림으로 섹스 장면을 미화하는 물건. 온전한 작품 하나가 그의 발치에 널브러져 있다. 조각품은 더없이 하얗고 빨갛고 노랗고 푸르다. 사소한 것들의 종합.
나는 그가 남긴 종잇조각을 쳐다본다. 볼품없는 종잇장 하나. 정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유서인가?’
사랑하는 이에게
기차가 바엔 역에 막 도착했을 때, 나는 형의 자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로써 나의 형제 다섯은 모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문틈으로 세찬 바람이 추억을 몰아간다. 조각조각의 아픔.
기자가 내게 내민 첫 질문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었다. 분노가 떨어진다. 애써보아도 소용없다. 속수무책.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당신을 구더기가 득실한 똥통에 집어넣고 싶군요.”
“미안합니다. 루트비히. 저는 그저 독자들의 요구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저를 너무 속물적인 인간으로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노력 중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단지 제게는 보다 궁금한 것에 대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다음 칸, 침실로 들어갔다. 역장은 나를 이해했다. 그는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흔쾌히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어떤 여인이 자고 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누웠다. 그리고 잠시 형을 생각하다 곧 잠들었다.
내가 향기라고 부르던 것이 마냥 즐겁게 느껴지지 않던 순간에 고개를 든 것은 늦은 오후였다. 너머에 여인은 누빈 이불을 돌돌 말아 고개를 처박고 있다. 불편함이 나를 자극한다. 나는 애써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턱에 손을 괴었다. 쓸쓸한 바람이 지상의 숲들을 매만지며 흩어졌다. 역장이 들어와 형의 장례식 절차가 적힌 쪽지를 건넸다.
“참석하실 건가요? 아니, 당연히 참석하겠죠?”
나는 역장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르겐역에서 하차하여 자동차로 이동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많은 기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큰 헤드폰을 낀 젊은이가 불쑥 들어왔다. 덜컥이는 리듬에 따라 노랫소리가 흘러넘쳤다. 그는 콩고네 길거리에 판매할 듯한 지저분한 티셔츠에 코를 문지르고 얇은 입술을 달싹이며 소음 속에 숨어들었다. 역장은 어깨를 한번 들썩이고는 가버렸다. 여인이 눈을 뜨고 나와 마주쳤다.
“비트겐슈타인 박사님이시군요.”
“저를 아세요?”
“당연하죠. 이 나라 사람치고 당신을 모를 수가 있나요? 어디를 가던 당신 이야기뿐인걸요.”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나는 약간의 떨림을 안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녀를 만나기 전, 꼭 한번 다시 읽고 싶었다.
“당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나는 느껴요. 가까이에 온 것을. 물론 그냥 농담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런 착각도 하곤 한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기분이 좋다는 뜻인가요?”
“물론이죠. 당신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좋습니다. 다만 차가 없다는 게…. 그래서 결국 비교적 짧은 거리를 세 번이나 기차를 갈아타는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괜찮아요. 아직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있으니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무척 젊으니까요.”
“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에 오전도 많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해 본 소리예요. 저는 늘 실없는 말을 하죠. 오래전부터 그냥 터진 입이라고 아무거나 말하곤 하죠. 그러니 그런 농담도 생기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당신이 그저 제 주위로 온다는 것만 생각하니깐요. 그냥 들떠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무척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으니까요. 물론 회사에 휴가를 내 어제부터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랄까…. 이상한 기대감이랄까…. 소박한 즐거움이랄까…. 아무튼 냉정해지기가 힘들 정도도 오후의 만남이 기다려지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처음이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하하. 정말 좋은 하루네요. 당신을 만진 적도 없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건, 떨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긴장이고 희망이고 기대죠. 어쩔 수 없는 걱정이고도 하고요. 지금 저는 당신이 보내준 오래된 사진을 기쁨으로 보고 있어요.”
“오래된 사진? 아! 그 사진. 잠시만요.”
나는 그녀에게 보낸 사진을 휴대폰에 꽉 채운다.
“23년이나 지난 일이죠. 그러니 오래된 일이 당연합니다. 나는 겨우 스물여덟이었으니까요. 그때 말입니다. 정말이지 풋풋함과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모습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은 누가 줘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검고 크고 우스꽝스러운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저건 유행이었어요. 저 때 찍은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멋진 주인공들이 어떤 안경을 끼고 다녔는지. 저는 마치 그 시절의 주인공처럼 쫙 빼 입고 다니길 좋아했거든요. 물론 저도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키도 작고 생김새는 평범하기 짝이 없으며 근육도 그다지 없었죠. 누가 봐도 샌님이잖아요. 저기 저 심문받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왜소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인지. 물론 이제 막 성인이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다들 그렇잖아요. 저 시절은 아무것도 정립된 것이 없이 그냥 시간이 흐름 속에 자신의 의지와 뜻이 뭔지도 모를 이상하고 구부정한 길로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 그냥 길을 잃고 헤매곤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만 말입니다.”
“그럼 후회하는 건가요?”
“후회요? 물론 당연히 무척 오랫동안 후회했죠. 사실 한순간이라도 그날을 후회하지 않은 적은 없었죠.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신 젊음을 송두리째 뺏긴 거잖아요. 너무 후회스럽죠.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시간 속에서 모든 상처에 딱지가 생겼고 그 딱지를 떼기를 수십 번도 더 한 뒤의 세월이 지났으니깐요. 하지만 정말 바보 같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바보 멍청이 같았어요.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을 나는 순진하게 믿고 그녀가 준 독 사과를 그냥 덥석 받아먹은 거예요. 그거에요. 마녀에게 완전히 놀아난 거죠.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땐 몰랐어요. 세상을 너무 몰랐던 거죠.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말이지 몰랐던 겁니다.”
“그날의 진실이 더욱 궁금해지는군요. 행여 당신 맘 내릴까 봐 그동안 선뜻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날의 진실요? 네. 알아요. 그날의 진실을 다들 궁금해하죠. 그리고 사실 당신은 제 입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극적인 고백을 기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날의 진실은 현재까지 그녀와 나, 그리고 하느님밖에 모르겠죠.”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는 믿는 척했죠. 나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어줄 이들이 필요했으니까요. 아시잖아요. 저는 갇힌 그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나의 결백을 주장하며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을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영향력 있는 이들을 찾아 요청했죠. 기독교 알림 연합회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고요.”
“알겠어요. 아무튼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빨리 기차가 달리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만….”
“네. 사랑해요!”
“저도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의 모든 것을 다 본 당신에게. 하하하”
“네. 그럼 조금 뒤에.”
웃음이 창에 걸리고 뒤편에 차장이 내게 다가온다. 나는 얼른 휴대폰에서 티켓을 찾아 내보인다. 끼익하는 인정. 옆 할머니는 시큰둥하게 질문을 던진다.
“이봐! 도대체 왜 이리 연착이 잘 되는 거야? 이놈의 기차는.”
“할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아,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안다는 거야?”
“컴퓨터가 알겠죠. 무슨 일인지. 다만 그놈의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명령만 해요. 기다려! 기다려!”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한마디 거든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니까요.”
모두 8개의 시선이 날 쳐다보고 두 개의 눈동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든다.
“맞아요. 우린 시킨 데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골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놈이?”
“그런 게 있어요. 할머니. 그냥 모르는 게 약이에요.”
차장은 큰 머리를 흔든다. 바람이 문틈을 타고 햇살은 걸터앉은 의자를 싹 문지르며 지나간다.
“하르겐역에는 곧 도착인가요?”
나의 질문에 차장은 천장을 한번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아마,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연착이 심해 매우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의 경고에 따라 짐을 싼다. 비닐을 버리고 음료수 캔을 비우고 시린 이빨에 껌을 집어넣는다. 차장이 지나간 자리로 쏜살같이 어린이 하나가 지나간다. 나는 여자를 생각하고 짐을 마무리하고 문을 점검하고 바깥의 햇살을 쳐다보고 심호흡을 한번 해 본다.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분다. 그리고 보슬비가 내린다. 텅 빈 풍경 속에 나무가 젖었다. 도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헛된 욕망덩어리.
2044년의 쓸쓸한 하루,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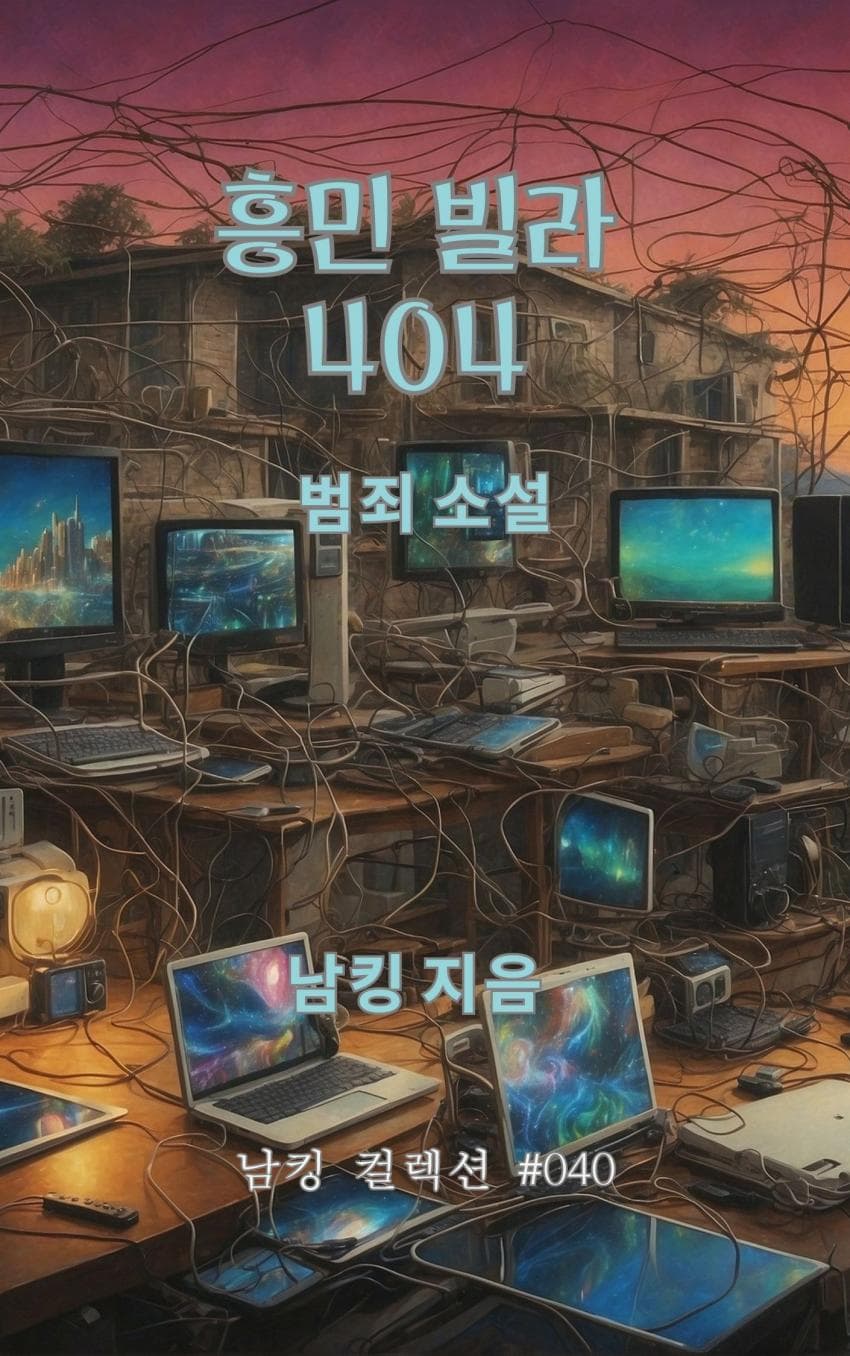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