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중, 오르상크의 불 (The Fire of Orthanc) 을 이용해 나팔산성의 성벽을 부수는 사루만의 군세. [이미지 출처]
톨킨 (J. R. R. Tolkien) 이 쓴 소설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 에는 여러 전투가 묘사되어 있다. 이 중 하나가 로한의 수비대와 사루만 휘하의 우르크 하이 군세가 격돌한 나팔산성 전투 (The Battle of the Hornburg) 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루만군이 "오르상크의 불 (Fire of Orthanc)" 이라는 "마법"을 사용해 나팔산성의 취약점을 깨부수고 돌파하는 묘사가 등장한다. 이 장면은 훗날 피터 잭슨 (Peter Jackson) 감독에 의해 제작된 소설의 실사영화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인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The Lord of the Rings: The Two Towers)> 에서 오르상크의 불이라 불리는 "화약"을 이용해 성벽의 취약점인 배수로를 공략하는 것으로 재해석되는데, 약점에 강력한 화력을 집중시켜 요새를 공략하는 전형적인 공성 전술을 극적으로 묘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지의 제왕> 에서 묘사되었듯, 성을 공략할 때에는 반드시 약점을 파악하고 그곳에 집중적인 공세를 퍼부어야 한다. 이런 약점 중 하나는 다름아닌 성문이다. 물론 이 사실은 수성측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성문 주위에는 방어측의 방어수단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성문은 여전히 주 성벽의 두터운 방벽보다는 훨씬 얇았고, 또 도시를 보호하는 형태의 성벽인 경우, 성문이 도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대로와 직접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장차 시가를 공략하는 데에도 성문의 확보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공성전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주로 성문에서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성문을 공략하기 위한 장치는 수도 없이 개발되고, 또 개량되어왔다.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를 충차의 경우도 단순히 무거운 통나무 등을 사람이 무작정 때려박던 것에서 출발해, 기동의 편의를 위해 바퀴를 달고, 투사체를 막기 위해 지붕을 덮고, 내구도를 높이기 위해 때리는 부분에 철판이나 철촉을 추가하는 등 거듭된 발전의 역사를 가진 공성 병기였다. 이후 송나라에서 개발된 화약이 유럽으로 전래되자 공성전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문 공략에서도 "오르상크의 불" 처럼 "마법같은" 파괴력을 가진 화약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빈 소재의 군사역사박물관 (Heeresgeschichtliches Museum) 에 전시된 두 개의 페타드 유물. [이미지 출처]
이런 화약을 이용한 공성 병기중 직접적으로 성문을 까부수기 위해 존재한,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형태의 병기를 꼽자면 단연 "페타드 (Pétard)" 가 제일일 것이다.
다소 우습게도, 페타드라는 말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방귀를 뀌다 (to break wind)" 라는 의미를 가진 은어인 "péter" 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현대 프랑스어에서 이 동사는 "깨뜨리다", 또는 "폭발하다" 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 이는 이 포스팅을 통해 설명할 공성 병기인 페타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족으로, 폴란드어로 페타드 (Petarda) 는 다이너마이트, 폭죽 등의 폭발물을 광범위하게 이르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역시 페타드가 화약을 사용한 공성 병기의 일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페타드는 대략 16세기부터 사용된 공성 병기이다. 미국의 전쟁사학자인 앨버트 마누시 (Albert C. Manucy, 1910 ~ 1997) 의 저서 <Artillery Through the Ages> 에 따르자면, 페타드는 "대포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it was hardly a gun)", 단지 화약을 가득 채워넣은 "강철 양동이 (an iron bucket)" 에 불과했으며, 그 어떤 투사체를 발사하기 위한 용도도 아니었다고 한다. 이 당시 이미 유럽에서는 화약이 폭발할 때의 가스압으로 투사체를 날려보내 성벽을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대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그 폭발력을 성문에 직접 때려박는 방법을 생각해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작자 미상 (n.d), <Blowing in a City Gate with a Petard>, 찰스 레이 (Charles Ray, 1925) 의 저서 <The Romance of the Nation> 의 삽화로 쓰였다. [이미지 출처]
페타드의 사용법은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했다. <The Romance of the Nation> 에서 사용된 위의 삽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문에 붙여 고정한 다음, 도화선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는 것이 전부인 병기였다. 다시 마누시의 저서에 따르자면, 당시의 일반적인 페타드는 무게가 작은 것의 경우 약 50파운드 (약 22.5kg), 큰 것의 경우 약 70파운드 (약 31kg)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성문에 유효한 타격을 주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두 사람 정도가 들기에 충분히 가벼운 무게였다고 한다. "강철 양동이" 안쪽에는 흑색화약이 가득 차 있었으며, 화약을 흘리는 것을 막고, 성벽에 못을 박는 판으로 삼기 위해 위해 일반적으로 약 2.5인치 (6cm) 정도 두께의 판자가 붙어있었다고 한다.
페타드의 뒤쪽이나 옆쪽에는 심지를 넣기 위한 원통형 구멍이 나 있었다. 공성이 시작되면 페타드를 다루는 병사, "페타디어 (Pétardiers)" 들이 페타드를 들고 성문까지 어떻게든 접근한 뒤에, 성문의 중앙에 페타드를 못으로 박거나 하는 방식으로 고정시킨 다음, 천천히 타들어가는 심지에 불을 붙이고 도망치는 식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앞서 이야기했듯 성문 주위의 방어는 매우 철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성문을 공략하는 페타디어의 임무 또한 자연스럽게 매우 위험할 수 밖에 없었다.
페타디어의 임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줄 단적인 예로, 1607년 6월 24일에 있었던, "프란체스코 델 몬테 후작 (Marquis Francesco Bourbon Del Monte)" 등의 지휘를 받은 토스카나, 코르시카, 스페인, 그리고 영국 출신의 선원들이 탄 약 20척의 배로 이루어진 토스카나 공국의 함대가 오스만 제국 치하에 있던 키프로스의 파마구스타 (Famagusta) 를 공격했던 기록을 들 수 있다.
이 당시의 기록에서는, 공격 준비 과정에서 사령관인 델 몬테가 성벽을 공략하기 위해 20개의 페타드와 "가능한 한 많은 페타디어 (as many petardiers as possible)" 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찾아볼 있는데, 이를 통해 페타드가 공성전의 주요 병기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더불어 페타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 또한 유추할 수 있다. 델 몬테가 계획한 공성 작전의 핵심은 다름아닌 페타드였다. 미리 파악해둔 성벽의 취약점 세 곳에 가장 큰 페타드를, 그리고 도시 남쪽의 리마솔 성문 (Limassol Gate) 에 나머지 페타드를 사용하여 전방위적인 공격을 가하는 작전이었는데, 델 몬테는 특히 정문의 페타디어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600명의 병사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페타드를 사용한 작전에 진심이었다.
이 작전은 추후 약간 수정되긴 하였지만 실제 전투에서도 페타드는 여전히 동원되었는데, 어이없게도 북동쪽 지점으로 페타드를 들고 가던 부대는 해자에 빠져 발이 묶임으로써 작전 자체를 실패하였으며, 영화 <반지의 제왕> 에서처럼 성벽 북쪽의 취약한 통로 (postern) 로 향한 부대는 성공적으로 페타드를 설치해 두 차례의 폭파 뒤에 돌파에는 성공하지만, 더 어이없게도 이쪽 통로는 아예 토사로 막혀버린 (terrapienata) 상태라 통과가 불가능했다. 설상가상 성벽을 오르기로 한 부대에서도 준비해 간 사다리가 성벽의 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대참사가 터지며 토스카나군의 공격은 완전히 좌절되었다. 결국 4시간만에 퇴각한 토스카나군은 며칠간 2차 공격을 계획하다가 결국 6월 1일, 아무 성과 없이 리보르노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공성전에서 페타드가 사용된 기록이 몇몇 있다. 1630년에 벌어진 만토바 공성전 (Siege of Mantua) 당시 수성측인 만토바 공국에서 남긴 회의록에서도 적의 페타드 사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발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페타드가 수성측에게도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페타드가 성공적으로 사용된 기록 중 하나로, 1639년 3월 21일, "알렉산더 레슬리 백작 (Alexander Leslie, 1st Earl of Leven)" 이 에든버러성 (Edinburgh Castle) 을 공략했던 기록이 있는데, 당시 레슬리는 수성측이 방심한 사이에 페타드를 설치해 성문을 순식간에 돌파하고, 단 한 명의 병력 손실도 없이 에든버러성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여 그 명성을 드높였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고고학자인 데이비드 콜드웰 (David H. Caldwell, 1951 ~ ) 은 이를 두고 "전쟁사상 가장 손쉽고 놀라운 요새 점령 사례 중 하나 (This has to be one of the most remarkable and easy captures of a major fortress in the history of warfare.)" 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두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페타드는 잘만 사용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강력한 공성 수단이었다.
30년 전쟁 당시에도 페타드가 사용된 기록이 있다. 30년 전쟁 당시 페타드가 사용된 기록은 의외로 찾아보기 어려운데, 확실한 기록은 1630년에 스웨덴군이 포메른 공국의 스타르가르트 (Stargard, 지금은 폴란드령) 의 "붉은 바다 탑 (Baszta Morze Czewone)" 을 공격할 때 페타드를 사용한 기록, 그리고 1626년 덴마크군이 실레지아의 레오프스쉬츠 (Leobschütz, 지금은 폴란드령 "그루브치체 (Gwubczyce)") 를 공략하며 성문을 페타드로 돌파한 기록 두 개 뿐이다. 페타드 운용의 어려움과 그 위험성으로 인해 이미 이 당시만 해도 페타드의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듯 하다. 이로 인해 30년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페타드의 사용 기록을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다.

코크 스미스 (Coke Smyth, circa 1800), <폴로니어스를 찌르는 햄릿> [이미지 출처]
좀 뜻밖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페타드는 영미권의 오래 된 숙어에 등장하는 단어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영문학의 대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 (Hamlet)> 의 3막 4장에서 나온, "Hoist with his own petard (스스로 심은 페타드를 터뜨리다)" 라는 대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장면에서 햄릿은 커튼 뒤에 숨어서 햄릿과 그의 어머니인 거트루드 왕비의 대화를 엿듣던 재상 폴로니어스를, 자기 아버지의 원수인 클로디어스 왕으로 착각해 찔러 죽인 뒤, 거트루드 왕비에게 자신의 영국행을 알리는데, 여기서 햄릿은 자신의 처지를 페타디어에 비견하며 "스스로 설치한 페타드에 터져죽는 공병의 꼴을 보는 것도 나름의 흥미거리 아니겠느냐 (For 'tis the sport to have the enginer hoist with his own petar)" 라고 비꼰다.
여기서 유래해 "Hoist with his own petard" 는 지금도 우리말로 치면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다", 또는 고사성어로 치면 "자승자박 (自繩自縛)" 과 같은 의미의 숙어로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인용했던 마누시는 그의 저서를 통해 이 숙어의 의미를 "신중하게 준비한 책략이 실현되는 순간을 표현하는 말 (an ancient phrase signifying that one's carefully laid scheme has exploded,)" 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좌우간, 이를 통해 페타디어들이 위험한 임무 속에서 제대로 빠져나올 틈을 찾지 못하고 폭발에 휘말려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2022년 2월 25일,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다리 위에서 자폭을 선택했던 우크라이나의 해병대원 "비탈리 볼로디미로비치 스카쿤 (Віталій Володимирович Скакун)" 의 사진. [이미지 출처]
전쟁과 전투에서 군인들이 임하는 모든 임무는 위험하기 마련이지만, 항상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위험한 임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하는, 실제로 실행되었던 이런 "위험한 임무" 는 보통 작전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할, 필수적인 임무였던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 위험천만한 임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페타디어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유럽 곳곳에서 벌어진 공성전에 동원되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비록 페타드와 페타디어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병기, 병종이 되었지만,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성질의, 위험하지만 필수적인 임무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병기를 들고 수행하는 병종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적들의 코앞까지 가서 원시적이기 짝이 없는 심지형 수류탄을 던져야 했던 근대의 척탄병이 그 예일 것이고, 기관총과 철조망을 뚫고 달려나가 기관단총이나 화염방사기 등 사정거리가 짧은 무기로 적의 참호를 점령해야만 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군 (Shock/Assault Troop) 이 또 다른 예일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벌어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초기, 물밀듯이 들이닥치는 러시아군의 행렬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해병대원인 "비탈리 볼로디미로비치 스카쿤 (Віталій Володимирович Скакун, 1996 ~ 2022)" 은 교각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임무에 자원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결국 자신이 탈출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병사는, 폭발물을 직접 터뜨리고 교각과 함께 산화하고 말았다. 그 희생 덕분에 그가 속했던 대대는 퇴각하여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한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사방에서 시시각각 덮쳐오는 전장에서 모든 군인은, 군인이기에 앞서 생명체인 인간이기에, 두려움을 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쟁사 속에서는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넘어서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군인들이 분명 존재한다. 여기서 용기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품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르다. 두려움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비인간적인 "무모함"에 지나지 않을 뿐, 용기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오히려 용기란 두려움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 자체가 다름아닌 "용기" 가 아닐까 싶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용기에서 비롯된 용감한 선택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변화해왔고, 또 진1보해왔다. 본능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놀라운 감투정신은 정체된 전황을 괄목할 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영웅" 이라고 부른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몸을 숙이고 도망칠 때, 혼자서라도 고개를 쳐들고 나아가 다가오는 공포에 맞설 수 있는, 또 그만큼 분명하고 숭고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영웅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크건 작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 또 어디에서나 비롯될 수 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두려움 또한 다만 내 마음 속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두려움은 언제나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내 마음 속의 무언가이다. 그리고 이 감정을 극복하고 고개를 들어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그만큼 움직이고,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국시대의 병법가였던 오기 (吳子, 440 ~ 381 BC) 는 그의 병법서 <오자병법 (吳子兵法)> 의 여사 (勵士) 편을 통해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천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 (一夫當逕 足懼千夫)." 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인용하기도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고사인데, 저 우크라이나 해병대원의 희생을 다시 생각하며 떠올려보니, 과연 이 고사는 저런 용기를 보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전우를 지켜낸 그 숭고한 감투정신이, 끝내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까지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짧은 포스팅을 마칩니다.
용기라곤 1도 없이 벙커에서 찌질거리기 바쁜 곡틴쉨은 오늘도 자기 전에 반성할 것.

P.S. 당분간 바빠서 군갤 댓글AI는 가동 중지하겠음. 글이나 싸야딩 헤헿
주요 참고자료:
Albert C. Manucy (1949), <Artillery Through the Ages: A Short Illustrated History of Cannon, Emphasizing Types Used in America>,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ichael J. K. Walsh (2015), <Chapter Four, Corsair Tactics and Lofty Ideals: The 1607 Tuscan Raid on Cyprus>, Marios Hadjianastasis, <City of Empires: Ottoman and British Famagusta> pp. 22-36,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Thomas F. Arnold (1993), <Fortifications and statecraft of the Gonzaga, 1530-1630>, The Ohio State University
David H. Caldwell (2019), <Edinburgh Castle Under Siege 1639-1745>, National Museum of Scotland
Grzegorz Podruczny (2019), <Siege activities during the Thirty Years’ War and their impact on the construction of modern fortresses in Pommern, Neumark and Schlesien>, Wydawnictwo Naukowe Uniwersytetu Szczecińskie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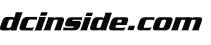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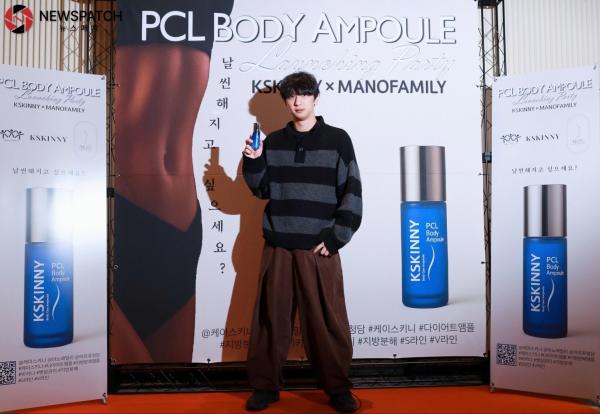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