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연재글인 청나라 바늘은 어떻게 조선보다 싸게 만들어졌을까? 에서 가내수공업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왜 청나라 바늘이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공납제나 국가통제에 의해 광업의 발달이 지연되었고, 중국과 달리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바늘 제작의 원재료비를 상승시켰으리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비는 바늘 제작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조선의 바늘 가공의 생산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지요.
그럼 조선 후기 수공업이 청나라와 경쟁할 만큼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었을지 살펴봅시다.
조선 수공업은 얼마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을까?
조선후기나 청나라 시대의 공장제 수공업, 즉 노동자를 고용해서 분업화된 공방을 운영하는 산업자본의 등장 여부는 일명 동아시아 자본주의 맹아론의 주된 논제입니다. 자체적으로 근대화와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느냐의 근거라고나 할까요?
왜 공장제 수공업에 주목해야 했을까요?
기존 연재글에서 소개한 명나라와 청나라의 수공업 양상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방직업이 영세한 가내수공업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농사를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가내수공업이 전적으로 개인의 근면성이나 인_구의 수에 그 생산을 의존하는데 반해서, 자본이 투자되는 공장의 경우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해 생산공정을 개선할 여지도 크고, 인센티브도 큽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 개선을 위해 분업이 발생하는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한명의 수공업자가 생산공정 전부를 담당하기 보다는 일부만 수행한다면 보다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고 이는 가공비용을 절감하게 해줄테니까요.
그럼 조선의 수공업에서 분업 양상은 어땠을지 살펴봅시다.
이 연재글의 1부인 조선은 철사, 바늘을 못만들었다 vs 안만들었다? 에서 조선 전기의 한양에 거주하며 조정에 등록된 경공장(京工匠)에 속한 침장(針匠)은 6명에 불과하며 부서별로 2명씩만 할당되어 그 생산규모가 영세하다는건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사슬갑옷을 제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쇄아장(鎖兒匠)도 언급한바 있죠. 이갑장과 함께 총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철사(鐵絲)를 제작하는 장인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바늘이나 사슬갑옷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철사는 아마도 해당 장인들이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이 분업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겠지요.
조선 전기 관공장(官工匠)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분업화 자체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이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분업화 사례들부터 찾아봅시다.
전에는 국가에서 주자(宙字)·측자(昃字) 두 가지 총통(銃筒)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하여 많이 만들고자 조전 도감(造箭都監)을 설치하였었습니다. 신이 가서 보았었는데, 목공(木工)은 먼저 화살대[矢斡]를 만들고 각장(刻匠)은 그 깃을 붙이는 곳을 뚫고 피공(皮工)은 깃을 붙이고 철장(鐵匠)은 화살촉을 만들고 또 연장(鍊匠)은 그것을 단련하였으니, 한 개의 화살을 만드는 데 공인(工人)을 5, 6명에 이르기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외방의 고을 같은 곳은 공장(工匠)이 없어 만들기 어려워서 반드시 민간(民間)에서 베[布]를 거두어 서울에 주고서 힘을 빌어 만들어 바칠 것이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성종실록 24년 1월 3일(1493년)
총통에 사용하는 화살, 일반적으로 장군전이라고 불리는 총통전(銃筒箭)을 제작하기 위한 임시관청에서 목공, 각장, 철장, 연장은 각각의 공정을 실시해서 하나의 총통전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선 전기의 수공업에서 분업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특히 군수공업 분야입니다. 이런 특징은 선조 38년(1605년)에 최초로 등장한 화기도감(火器都監)의 작업내용을 기록한 화기도감의궤(火器都監儀軌)에도 나타납니다.

---화기도감의궤에 등장하는 1588년 제작된 육군박물관 소장 소승자총통, 가늠자와 가늠쇠, 개머리판구조 등은 명종 시기인 1555년 최초 입수한 일본 조총의 영향으로 보인다.----
화기도감의궤에서는 청동의 제련을 담당하는 권노장(權爐匠), 철제 화기의 단조를 담당하는 야장(冶匠), 주조가공을 담당하는 주장(注匠), 구멍을 뚫거나 총열 내부를 가공하는 천혈장(穿穴匠), 가늠쇠와 가늠자를 가공하는 조성장(照星匠), 격발장치를 가공하는 두석장(豆錫匠), 총기의 목제 총신과 손잡이를 제작하는 소목장(小木匠)과 목수(木手)의 상세 공정과 1명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업화가 일반적이었는지, 민간의 수공업자들도 수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료가 부족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전통 수공업의 분업화 수준이나 직능별 구분에 대한 기록은 1950~1990년대의 생존 노인들에게 직접 구전조사를 통해 획득한 증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분업이 이루어질 여건이 마련된 시점에 대한 문헌기록은 최소 19세기에나 확인가능하기 때문이죠. 언제부터나 민간영역에서도 수공업의 분업화가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수공업자가 일정 이상의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어 독자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수공업 중 분업화 연구가 어느정도 진행된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도자기를 굽는 사기장이 있습니다.
조선의 도자기 산업의 분업화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도성의 경공장(京工匠)으로 국용의 자기를 굽는 사옹원(司饔院)의 사기장(沙器匠)수가 380명, 왕실의 자산을 담당하는 내수사(內需司)에 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옹원에서는 인원의 규모가 크므로 이론적으로 분업화 발생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사카와 다쿠미의 사진. 1931년 40세의 나이로 요절하였습니다.----
조선 도자기 연구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집한 조선 문화재를 해방 후 한국에 기증한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의 동생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는 1914년 조선으로 건너와 조선총독부 농공상부 산림과 직원으로 일하면서 1931년 "조선도자명고(朝鮮陶磁名考)"를 발간합니다. 여기에는 19세기 사옹원이 경기도 광주에 설치한 분원(分院)의 기록인 분주원보등(分廚院報謄)을 인용해 도자기 가마의 운영이 분업화되어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옹원 분원의 운영은 물레를 돌려 점토로 모양을 만드는 조기장(造器匠), 모양을 다듬고 굽을 깎는 마조장(磨造匠), 그릇을 말리는 건화장(乾火匠), 가마에 불을 때는 부화장(釜火匠), 가마의 온도를 관리하는 남화장(覽火匠), 초벌구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화청장(畵靑匠), 유약을 입히는 착수장(着水匠)을 비롯한 10여종 이상의 공정 담당자들이 분업화되어 있고, 이들은 도자기에 소요되는 흙을 옮기거나 잡역을 담당하는 400여명의 잡역군들의 지원을 받아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업화는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민간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국대전에 기록된 지방이나 각 군현에 소속된 외공장(外工匠) 소속의 사기장은 군현별로 1~2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한말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 물레로 독의 형태를 빚고 있다. 민요의 사기장들은 도자기 제작공정 전체를 다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관영수공업장 외에서의 도자기 생산규모가 영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걸 알려줍니다. 장인 개인의 집에서 가족 단위로 도자기를 구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니까요.
국가 주도의 도자기 가마 이외의 민요(民窯)들은 대체로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가족 내에서 영세한 규모로 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업화가 민간영역에서 일반적이긴 어렵겠지요.
1928년 조사에 의해 작성된 조선총독부의 경상북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경상북도에서 운용되고 있는 도자기 공장이 14개였으며, 조업원의 총계는 128명으로, 한 공장당 9.14명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인원을 많이 투입한 공장의 경우 17명이었고, 8개의 도자기 공장은 5~7명의 인원만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아마도 조선 후기 경제발전 과정에서 가내수공업 수준에서 벗어나 생산규모가 증대되었으리라 추정되지만, 사옹원 분원과 같이 분업화가 활성화될 만큼의 대규모 민간 도자기 가마는 19세기에서도 드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구한말 기산 김준근의 옹기 가마 풍속도----
게다가 조선시대 국가가 운영하는 관요(官窯)를 대표하는 경기도 광주의 사옹원 분원에서 도자기 가마에 소요되는 백토(白土)나 땔감의 조달은 주변의 농민의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공납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국가의 강제수취 없이는 분업화가 가능한 대규모 도자기 가마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걸 보여줍니다.
또한 조선 후기 관요는 경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시달렸으며 소속 사기장들은 사적으로 제조한 도자기를 팔아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고, 흉년에 아사하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조선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도자기를 생산하는 관요는 구성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없이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었다는거죠.
국가의 강제적 수단 없이는 분업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선의 관요에서 나타나는 도자기 제작의 분업화는 대중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조선 후기의 분업화 사례의 대표적인 연구대상은 도자기산업보다는 가마솥 등을 주조하는 수철점(水鐵店)과 방짜유기로 유명한 유기점(鍮器店)이기 때문에 도자기 산업만으로는 조선의 분업화 발전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거나 느려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 수철점(水鐵店)과 유기점(鍮器店)을 통해 조선 후기에 분업화가 본격 발전했다고 해석하는 걸까요?
먼저 조선 후기의 유기(鍮器) 생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조선의 유기 산업의 분업화

----조선시대 방짜유기, 대구 방짜유기 박물관 소장----
예로부터 여름에는 자기를 쓰고, 겨울에는 유기를 쓰는데 담아둔 음식이 쉽게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겨울과 여름이 따로 없이 모두 유기 밥그릇에 밥을 담는다. 옛날에는 오로지 서울에 사는 부호 집안에서 사용했지만, 지금은 시골의 볼품없는 집안에서도 유기 밥그릇과 국사발이 여럿 없는 집이 없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섬용지(贍用志)
조선 전기에 귀한 구리합금으로 제작한 유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왕실이나 사족층의 전유물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 서민들까지 사용할 정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유기의 대중화는 17세기 일본의 구리생산량이 증가하고 조선이 이를 대규모로 수입하면서 구리의 수급이 용이해지고, 조선 자체적으로도 광업이 발전하면서 구리광산이 개발되어 가능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발전과 인_구성장, 그리고 유기사용 문화의 보급은 유기를 제작하는 수공업을 빠르게 발전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기의 생산이 단순한 가내수공업을 넘어서 임금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수공업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사료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평양감영계록(平安監營啓錄)에는 1842년 평양 근방의 상원(祥原)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에 등장하는 유기점은 위명규(韋明圭)라는 인물의 소유로서, 그는 유기점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집 주변에 구리광산인 동점(銅店)을 만들고 이를 제련하는 야장(冶匠)을 고용해 유기제작에 필요한 구리를 조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영세한 가내수공업자가 아니라, 유기를 제작하는 유기점에 다수의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유기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 채광과 제련까지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투자한 물주(物主)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유기점의 매매문서를 통해서 유기제작의 규모가 꽤나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가내수공업에 비해 공정의 분업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시기에 분업화된 유기제작공정이 사용되고 있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업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봅시다.

-----구한말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 유기를 만들기 위해 형틀에 구리를 주입하고 있다.----
조선시대 유기의 제작방식은 크게 붓배기와 방짜로 나뉩니다. 붓배기는 주조 방식으로 유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공정은 단순하게 형틀에 구리를 붓는 부리(주물, 鑄物)와 이를 절삭가공해서 완성하는 가질로 나뉩니다.
공정을 책임지는 대장 1명, 부질을 담당하는 철물부(鑄物夫) 1명, 풀무를 담당하는 조수 1명, 가질을 담당하는 2명과 원재료 운반 인부 1명으로 5~6명이 1조를 이루는 것을 "틀"이라고 하는데 1틀당 1일에 20여벌의 유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9분 46초부터 방짜유기의 제작공정 영상---
방짜유기는 좀 더 복잡합니다. 방짜유기는 보다 얇고 섬세한 가공을 위해서 망치로 두들기는 단조공정이 포함됩니다. 먼저 주조를 하는 부리 공정을 담당하는 겉대장 1명, 풀무를 담당하는 받풍구 1명이 구리를 녹여서 바둑이라고 불리는 동합금을 만듭니다. 붓배기와 달리 공정 전체를 담당하는 대장은 부리가 아닌 단조공정의 리더가 맞게 됩니다.
이어서 이 바둑을 단조공정을 담당하는 대장 1명과 3명의 망치꾼이 두들기는데, 이 단조공정에는 또한 네핌가질이란 성형을 담당하는 1명과 네핌앞망치 1명, 그리고 단조 중 가열을 위한 풀무를 담당하는 안풍구 1명이 있습니다. 단조가공을 마치면 다시 성형을 위한 가질 2명이 가공을 담당합니다.
3단계의 공정은 11명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방짜유기의 제작은 붓배기에 비해 보다 분업화가 필요하고 필요한 인력규모도 크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제조공정의 분업화 양상은 1960년대 김영호(金泳鎬) 교수가 당시 생존해있던 안성유기를 가업으로 해왔던 집안의 노인들과의 인터뷰와 당시 현대 남아있던 전통 안성유기의 제작공정을 참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업이 언제 시작되고 발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합니다. 안성에서의 유기산업 자체가 17~18세기에 시작되었고, 본격 발전은 19세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기 제작의 분업화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장(鍮匠)을 불러 서판(書板)글씨를 쓸 때에 종이 밑에 받치는 널조각을 만들게 했다.
묵재일기(默齋日記), 1546년 4월 18일 갑진
유장(鍮匠)이 서판(書板)을 갖고 왔기에, 목면 6필(匹)을 더 주었다. 또 쌀 1말과 목면 6필로 유기 수저 각 두 벌을 샀는데, 제사 때 쓰려고 한다.
묵재일기(默齋日記), 1546년 4월 27일 계축
유장(鍮匠)이 와서 쌀 6말을 받더니 놋쇠를 살 것이라고 했다.
묵재일기(默齋日記), 1546년 4월 19일 을사
조선 전기의 문신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이 남긴 묵재일기(默齋日記)는 조선 전기의 유기장인들이 대량으로 유기를 제작하기 보다는 주문생산 방식으로 영세하게 유기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수급을 미리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축적도 어려웠고, 유기 제작에 필요한 망치를 빼앗기는 것으로 생계의 위기를 호소할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사료입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대동법의 도입과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店'이라 불리는 민영수공업장이 등장하고 장인들이 집단거주하는 '店村'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대량생산으로 시장에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주문생산이 압도적이었죠.
19세기 초중반에 서유구가 임원경제지에서 설명한 "옛날 부자집에서나 유기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감안하면 조선의 유기산업에서 일정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빨리 잡아도 18세기 중반 이후에야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가마솥등을 제작하는 수철점(水鐵店)의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조선 후기 수철점(水鐵店)의 분업화
조선 후기 야철수공업의 임금노동자 고용과 분업화에 대한 기록 역시 평양감영계록(平安監營啓錄)의 살인사건 덕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철종 11년(1860년) 평안도 영변(寧邊)에서 이갑규(李甲圭)가 경영하던 수철점(水鐵店)에는 다수의 임금노동자가 고용되었습니다. 직능에 따라 노동자들의 구분이 이루어졌는데 성기편수(成器片手), 역군(役軍), 첩수(帖首), 단속군(團速軍)등의 직책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분업화된 공정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해줍니다.
수철점은 철광석을 제련해서 가마솥과 같은 무쇠 주조철물을 제작하는 수공업장을 말합니다. 유기와 달리 가마솥은 조선 전기부터 대중적으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도 수철장(水鐵匠)은 유기장에 비해 자주 언급되죠.

---권병탁 교수. 한국 수공업 연구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http://bbkk.kr/tour/view/3102 참조----
조선시대의 유기제조공정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게 직접 노인들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김영호(金泳鎬)의 업적이라면, 조선 후기 제철기술과 야철수공업에 대해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건 권병탁(權丙卓) 영남대 경제학 명예교수 덕분입니다.
권병탁 교수는 1960년대부터 쇠부리유적지를 중심으로 현지답사와 야철수공업에서 일했던 노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조사했습니다. 그가 정리한 가마솥과 같은 주조철물을 제작하는 용선(鎔銑) 수공업의 공정을 살펴봅시다.
권병탁 교수가 확인한 전통 가마솥 제작방식을 "익부리"라고 합니다. 이 익부리 가마솥을 만드는 공정은 총 4개의 공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마솥의 형태를 잡기 위해 주물사를 가지고 틀을 만든다.----
먼저 바숨이라 불리는 주조용 틀(鑄型)을 만드는 작업은 점토를 이겨서 형틀을 만듭니다. 이것을 바숨내기라고 합니다. 이 작업의 우두머리를 도래질 편수라고 부릅니다.
바숨내기 공정을 수행하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을 감독하는 대장인 도래질 편수 1명,
점토와 짚등을 물에 섞어 이기는 흙건즈리기 2명,
점토를 빙빙 돌리면서 형틀을 만드는 손짓군 2명,
잡무와 운송을 담당하는 허드렛군 2명,
점토와 모래를 섞어 뻑뻑한 주물사를 만드는 질물군 1명,
만들어진 주형인 피바숨을 장작불에 데우는 수증군 1명,
형틀 내외에 3개의 무쇠조각인 봉쇠를 끼워넣어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는 봉쇳군 1명
총 10명이 투입됩니다.
형틀인 바숨을 성형한 후에 이를 구워내는 것을 불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의 우두머리를 불편수라고 부릅니다. 불작업에서는 형틀을 일종의 가마에 넣어서 구워내는데 이 가마를 적집이라고 부릅니다. 적집을 쌓고 형틀을 구워내는 공정에 투입되는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을 총괄하는 불편수로 원불편수 1명
그를 보조하는 조수로 뒷불편수 1명
적집쌓기를 하는 10명의 잡부
총 12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셈이고, 기일은 2일이지만 적집쌓기 인원은 1일만 일해도 됩니다.

---기산 김준근의 가마점 그림, 좌측에 발로 밟는 풀무를 사용해 송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숨을 구워내면 이제 여기에 넣을 무쇠를 녹여내야합니다. 이를 위한 작업을 골작업이라고 하고 이를 담당하는 우두머리가 골편수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을 총괄하고 풀무로 바람을 불어넣을 구멍과 용광로인 무질부리가마를 만드는 골편수 1명
조수인 둑수리 1명
잡무를 담당하는 허드렛군 5명
숯과 판장쇠(선철)를 용광로에 집어넣는 쇠치기 2명,
풀무를 밟아서 공기를 붉어넣는 불멧군 16명이 2교대로 공정에 투입됩니다.
---00:50초부터, 현대의 가마솥 제작과정 중 쇳물 붓는 과정과 전통방식은 크게 차이가 없다.----
최종작업은 용광로인 무질부리가마에서 흘러나오는 쇳물을 형틀인 바숨에 주입하는 공정으로 오리(鑄造)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 별도의 우두머리가 없고 골편수나 불편수의 지휘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며 투입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광로의 구멍을 뚫어 쇳물을 흘러내리는 역할을 같이 하는 골작업의 둑수리 1명
형틀인 바숨을 구워낸 가마인 적집을 무너뜨리는 큰괭이꾼 2명,
바숨을 끌어다가 정해진 자리로 옮기는 솥내기 2명, 솥굴리기 2명
쇳물을 도가니인 오리에 넣어 옮기는 오릿군 6명,
도가니에 짚의 재를 넣고 도가니를 기울일 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나빗짚군 1명
형틀에 쇳물을 부어넣을 때 점토로 만든 깔대기를 형틀 구멍에 설치하는 발매깃군 1명,
오릿군이 쇳물을 부어넣을 때 깔대기와 형틀을 맞도록 고정시키는 가래지금군 1명,
형틀에 쇳물이 부족할 때 재빨리 무쇠바가지인 쪼글쇠로 쇳물을 보충해넣는 쪼글쇠잡이 1명,
총 16명의 잡부와 둑수리 1명이나 골편수, 불편수 각 1명이 투입됩니다.
주조공정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이 공정 자체가 아주 짧은 기간, 인터뷰에 의하면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같게" 단숨에 진행되면서도 쇳물을 다루는 일이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실수해도 가마솥이 못쓰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가마솥의 제작공정에서 도래질편수, 불편수, 골편수 3명과 형틀을 만드는 손짓군, 공정의 조수 역할을 하는 뒷불편수, 둑수리 이외에는 대부분 잡역로서의 단순노동자에 불과하며 이들은 여러 공정의 역할을 겸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권병탁 교수는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업화된 공정의 출현은 조선 후기 수공업이 가격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100%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권병탁 교수가 조사한 19세기말의 수철점 운영은 분명히 그 이전까지의 조선 수공업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건 가내수공업 위주로 운영되던 조선 수공업과는 전혀 다르죠. 이는 분명히 생산성을 개선시키긴 합니다만, 분업의 결과로 보기는 애매합니다.
구한말 유기점이나 수철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단순노동을 하는 단기 임금노동자의 고용입니다. 각 공정의 대장 또는 편수라고 불리는 전문기술자들이 공정에서 필수적이고 장기고용이 필요한 존재라면, 단기 임금노동자들은 인근의 무토지 빈농으로 날품팔이를 위해서 임시로 고용됩니다. 이들은 일거리가 없을 때에는 나무를 하거나 숯을 굽는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음이 증언을 통해 확인됩니다.
조선 후기 임금노동의 출현은 17~18세기 인_구증가로 인해서 토지면적 대비 인_구증가의 결과물입니다. 무토지 농민이 증가하고 동시에 대동법 도입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도시에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랑하던 무토지 농민들이 서울로 유입, 17세기 후반부터 서울의 인_구가 증가하죠. 이로서 임금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발전합니다.
권병탁 교수가 조사했던 수철점들이 위치한 경상도 청도군과 같은 향촌사회에서도 날품팔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빈농의 수가 증가하고 이는 임금노동자의 고용이 가능한 여건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이 임금노동자 덕분에 가마솥 주조나 방짜유기 제조의 생산규모는 비교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편수나 조수들만으로 하는 것보다 증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1회의 전체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틀인 바숨의 수를 동시에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가마솥을 주조할 수 있게 하는거죠.
이를 통해서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임금은 비교적 적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동을 분업화한 결과로 생산성이 증가한건 사실이지만 공정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의 증가와는 좀 거리가 있죠.

----고전 경제학의 시초로 알려진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
한 사람은 철사를 뽑고, 다른 하나는 철사를 곧게 편다. 세번째 사람은 철사를 자르고, 네번째 사람은 그 끝을 날카롭게 만들고, 5번째 사람은 핀의 머리부분을 만들기 위해 상단을 가공한다. 핀의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2~3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핀 머리를 핀에 붙이는 일과 핀이 빛이 나게 다듬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핀을 팔기 위해 종이에 포장하는 것이다....(생략)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1일에 4만8천개가 넘는 핀을 제작할 수 있다. 이는 1명당 4,800개의 핀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각각의 고유한 작업에 대해서 교육받지 않고 핀을 만드는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면 1일에 20개의 핀도 만들 수 없을 것이고 단 1개도 만들지 못할지도 모른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권 "노동생산력 향상의 원인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분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다만 애덤 스미스가 진짜로 핀 제작공정을 이해하거나 목격하고 이 글을 썼느냐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도 하죠. 뭐 그게 중요한건 아니지만요.
애덤 스미스가 설명한 핀 제작공정은 바늘의 제작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핀 공장의 분업화가 가능한건, 애덤 스미스가 설명한 각각의 공정들이 사실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사를 뽑는 사람과 펴는 사람, 자르는 사람, 그 끝을 가는 사람등.. 각각의 공정은 한번에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철사 뽑는 사람은 펴는 사람이 화장실을 가던, 휴가를 가던 말던간에 계속 뽑기만 하면 됩니다. 언젠가 돌아와서 펼테니까요.

----1930년대 경북 청도군 솥계의 가마솥 제작공정의 사진. 진흙으로 만들어진 형틀인 바숨들이 보인다.----
각각의 공정이 분리되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분업화된 작업담당자는 자기 작업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구한말의 작업공정, 특히 가마솥 주조공정은 공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틀인 바숨을 만들고, 굽고, 쇠를 녹여서 바숨에 부어서 가마솥을 만드는 전체 공정은 물흐르듯이 이어집니다.
형틀인 바숨의 제작은 비교적 분리되어 있지만, 그 이후 공정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바숨만 계속 만드는건 까다롭습니다. 부피가 커서 보관도 까다롭고, 장기보관하다가 파손되기도 쉽죠.

-----방짜유기의 동합금 원형 판재인 바둑, 미리 만드는게 용이하다.----
위에서 소개한 방짜유기의 경우는 구리합금으로 된 원형판재인 바둑을 주조하는 부리공정을 분리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는 합금의 조합비를 맞춰서 주조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유통비용 문제일수도 있구요.
여기서 중요한 분업화의 포인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료를 가지고 최종 생산품을 만들기 까지의 공정이 연속적인가 아니면 분리되어있느냐에 따라서 공정의 분업화가 생산성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영향을 끼친다는거죠.
즉 원료와 최종생산품 사이의 중간재가 제작되고, 이것이 독립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야만 본격적으로 "분업화"에 의한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하나의 공장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사실 실제 생산성이 극대화되는건 각 공정이 독립적인 공장에서 이루어졌을때가 더 효과적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실 수도 있습니다.

----1769년 프랑스의 핀 공장의 제작방식 삽화----
바늘을 사례로 든다면, 바늘을 제작하는 장인이 직접 철사를 뽑고 바늘로 가공하는 것보다는 철사를 뽑는 사람과 바늘을 가공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작업하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면 철사를 제작하는 장인이 철사를 제작하고, 바늘을 제작하는 장인은 그에게서 철사를 사서 바늘로 가공하기만 하는게 더 생산성 극대화에 유리하죠. 청나라 산서성 대양의 바늘제작공정 처럼요.
철사를 제작하는 장인은 바늘 제작하는 특정 장인에게만 파는게 아니라 장식품 만드는 사람, 초롱을 만드는 사람, 핀 만드는 사람에게도 팔고 또 다른 바늘 장인에게도 팔겁니다. 그의 철사 생산공정은 분리되어 있어서 누구도 신경안쓰고 철사만 만들면 됩니다. 공정이 분리되어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구한말 수철점의 분업화 사례는 조선 수공업의 생산성 수준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못합니다. 임금노동자의 고용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가마솥의 주조공정에서의 분업화는 협업을 통한 단위생산량 증가 수준에 그치니까요.
게다가 임금노동자의 고용 이외에는 이러한 작업 구조가 조선 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한말 수철점에서 잡무를 담당하면서 겸업하는 임시직 노동자들을 제외한 전문기술자 인력은 편수와 조수들을 고려할 때 전체 공정에서 7명에 불과합니다. 공정 전체에서 50여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이 분리되어 병행하기 어렵고, 잡역부가 겸업한다고치면, 실제 인원은 20~30명 정도였을 겁니다.

-----조선시대 가마솥, 옛길 박물관 소장----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서 가마솥 등을 주조하는 수철장(水鐵匠)의 경우는 각 단위를 1명이 아니라 1호(戶)로 잡습니다.
수철장은 경국대전에서 대야(大冶), 중야(中冶), 소야(小冶)로 구분되는데, 대야는 25~20인, 중야는 19~15인, 소야는 14인 이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는 대호(大戶)라고 해서 50결 이상의 토지를 경작하는 대규모 가족집단도 존재했기 때문에 수철장은 단일한 가족일수도 있고, 몇개의 가족들로 구성된 장인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작업 특성상 원활하게 형틀을 만들거나 굽고, 철을 제련하거나 녹여서 주조철기를 제작하려면 인력규모가 일정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철장은 다른 장인들과 달리 호(戶)단위로 구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구한말의 분업화된 가마솥 제작 공정이 조선 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자의 노동력 규모는 생각보다 차이가 안나고 있으니까요.
즉 김영호의 안성유기 연구나 권병탁의 철물제작공정 연구의 분업화 사례는 19세기까지 조선이 유의미한 분업화된 생산공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하는 근거로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산 공정의 분업화보다는 가내수공업의 한계로 전문기술자의 수 대비 생산량이 제한되는 것을 임금노동자의 고용을 통해서 해소한 것으로 보는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거죠.
공정의 구조상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개선이 조선 수공업에서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료와 최종생산품 사이의 중간재의 존재, 그리고 그 분리된 공정을 담당하는 직능을 담당하는 수공업자가 존재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주조공정은 이런 공정분리가 이루어질 여지가 적은 편입니다. 조선 전기나 중기까지의 수철장(水鐵匠)은 아예 철의 최초 제련공정인 쇠부리작업부터 시작해서 가마솥이나 농기구같은 최종생산품의 생산까지 직접 담당하는 존재였거든요. 이는 개별 공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였을 겁니다.
권병탁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적어도 19세기에는 철의 생산과 주조철기의 제작은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김권일이 일본자료를 통해 발견한 결과는 좀 다릅니다.
1904년 러시아 지질학자 에두아르트 에두아르도비치 아네르트(Анерт, Эдуард Эдуардович, 아네르트는 발트 독일계 러시아인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산대학을 졸업한 러시아인입니다. 일본 자료에서는 폴란드인이라 써있었던 모양입니다. )는 함경도 회령 인근에서 사철을 녹여서 선철을 생산하는 쇠부리가마와 250m 떨어진 위치에서 해당 가마에서 만든 선철로 주조철기를 제작하는 무질부리가마를 관측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조선 전기처럼 제철-주조공정의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동시에 존재했음을 알려주죠.
제조공정의 분리나 중간재 여부를 검토하기에 보다 적합한 것은 단조가공이 가능한 연철(鍊鐵), 조선식으로는 정철(正鐵)을 가공하는 대장장이(冶匠)들, 그리고 철물을 제작하는 장인들입니다.
조선의 대장장이들이 어떻게 철물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 전기 대장장이들은 어떻게 철물을 만들었을까?
조선 후기나 구한말 제철공정과 주조공정의 분리는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가용한 연료자원의 한계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의 삼림자원이 황폐화되기 쉬웠고 동시기 청나라와 달리 대규모 제철산업이 집중되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철을 사용하는 대장장이는 고대부터 제철공정과 단조가공이 분리되어있었습니다.
또 주철장(鑄鐵匠)은 바로 녹여서 그릇을 만드나, 정철장(正鐵匠)은 녹이는 자와 그릇을 만드는 자가 각각 다르므로 세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예전대로 세를 거두지 마소서.
성종실록 4년 2월 11일 (1473년)
정철장(正鐵匠)은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수철장(水鐵匠)은 조선시대에 무쇠를 생산하고 주조철기까지 직접 생산하는 이를 지칭하지만 정철장의 경우는 무쇠가 아니라 탄소함량이 낮은 괴련철을 생산하고 정련하는 원료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병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연철을 생산하는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광석과 목탄을 재료로 쇠부리가마에서 잡쇠라 불리는 괴련철을 생산합니다.
잡쇠를 강엿쇠둑에서 가열하고 망치로 두들겨 불순물과 탄소함량을 줄여 강엿쇠를 생산합니다.
강엿쇠를 판장쇠둑에서 가열하고 두들겨 정련해 장방형으로 가공해 판장쇠를 생산합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철정(鐵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장장이가 단조가공할 수 있는 연철(Wrought Iron)은 원래 고대부터 원료의 제작자와 단조가공을 하는 대장장이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장방형으로 가공된 판장쇠 또는 철정(鐵鋌)이라 불리는 철덩어리는 아시아던 유럽이던 상관없이 비슷한 모양으로 유통되었고 고고학 발굴과정에서 발굴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모든 정련공정을 마친 정철(正鐵)만 유통되거나 공납의 대상이 된건 아니고, 정련이 완료되지 않은 잡쇠나 강엿쇠로 추정되는 신철(薪鐵)도 같이 유통된것 같은데, 이 경우는 사용 위치인 관영공사 현장이나 대장장이에 의해 정련공정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대장장이의 필수품인 풀무, 모루, 망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작업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건 조선의 대장장이들이 여기서 분업화로 한발 더 나아갔느냐의 문제입니다.

----김홍도의 풍속화에 묘사된 대장장이----
조선 전기의 야장(冶匠), 즉 대장장이들은 연철로 제작하는 철물 대다수를 제작했습니다.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의 묵재일기(默齋日記)에서 16세기 중반의 대장장이들은 말굽에 씌우는 편자(馬鐵), 자귀(錯耳, 목재 다듬는 도구), 톱(鋸子), 삽(鍤), 끌(鑿子), 송곳(錐), 비비송곳(鑽), 도끼(斧), 문틀에 설치하는 지도리(樞鐵), 철장식(粧鐵), 장롱의 장식용 장석(將飾鐵), 등자(登子), 칼(刀子)을 제작한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건축에 사용하는 쇠못(鐵釘)은 대장장이들이 제작하는 농기구 및 공구나 장식 못지않게 대장장이들의 중요한 생산품이었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쇠못은 고위직에 있는 사대부도 대량으로 쉽게 구하기 어려웠음을 추측케 하는 사료가 남아있습니다.
이승조가 장죄를 범한 것은 그 장물을 자기가 착복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승조는 경상 수사였고 홍귀달(洪貴達)은 강원 감사(江原監司)였는데, 이승조에게 청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함창(咸昌)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으니, 철물(鐵物)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하므로, 철정(鐵釘) 1백 50개를 보내 주었던 것이다. 홍귀달에게 물어보니, 그도 그렇게 대답하였다. 이는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한 것이니, 그것으로써 이승조에게 허물을 줄 수는 없다.
성종실록 21년 12월 17일 1490년
대장장이는 주조철기를 만드는 수철장에 비해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 연료의 소모량, 가마의 크기등 필요한 자원의 양이 매우 적었고, 아주 영세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국대전에 기록된 외공장 중 야장(冶匠)의 수는 462명에 불과하며 8도를 총괄하는 감영이나 병영의 경우 6명, 주(州)의 경우는 2명, 대부분의 군현은 단 1명씩만 존재합니다.
조선 전기 대장장이의 생산단위가 1인 단위로 매우 영세하고 가내수공업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조선 전기 대장장이의 단조 철기 생산체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장장이들은 다품종의 단조철기를 주문받아 소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업을 영위했습니다.
특정한 물품에 전문적인 대장장이가 존재하지 않고 조악한 품질로 이것 저것 제작하는게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묵재일기는 조잡하게 만들어진 대장장이의 생산품에 투덜거리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공정분리는 고사하고 가마솥 제조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업적인 협업도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당시 대장장이들은 전업 수공업자가 아니라 농업을 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종 15년(1415년) 경공장(京工匠)으로 동원된 대장장이를 3월부터 7월까지는 귀농(歸農)케 하자는 제안이나, 명종 3년(1548년) 수철장(水鐵匠)으로 농지를 보유한 이를 역참을 담당하는 역자(驛子)로 배정한 사례는 대장장이나 수철장과 같은 장인들이 수공업에 임하는 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낮은 생산성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전 연재글 조선과 청나라 바늘로 보는 공납과 국유화의 폐해(링크) 에서 설명한 조선 광공업의 공납제와 국가통제로 인한 느린 발전속도로 인한 원재료 문제도 존재했겠지만, 생산단위가 영세하고 주문생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원재료가 풍부하더라도 생산단가를 높이고 공급량을 감소시킵니다.
위에서 소개했듯이 쇠못의 착복이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꽤나 귀한 물건이었을 뿐더러, 철제 농기구나 공구도 꽤나 귀한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1456년 작성된 사육신 하위지의 유서, 한국고문서 자료관 참조-----
단종복위에 참여한 사육신 하위지(河緯地 1412~1456)가 조카 하원(河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유서에는 솥과 동이, 숫가락등 취사도구와 쟁기, 작두, 호미, 괭이와 낫, 도끼, 자귀와 끌등의 다양한 철제 농기구 및 공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재 농기구는 제외되어 있어서 철제도구들이 당시에 매우 귀하게 취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죠.
이는 조선 전기 대장장이들이 조선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철물을 충분히 공급할 만큼의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6세기 관청수공업이 점차 붕괴되고 민간수공업 위주로 개편되기 시작하면서 철물의 생산과 유통은 점차 활발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5세기 말에는 한반도에 드디어 지방의 시장들이 등장하기에 이르죠. 왜란과 호란 이후 대동법이 도입되면서 조선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상품화폐경제의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변화들은 조선 후기 대장장이의 생산성을 개선시키고, 분업화나 공정분리로 이어졌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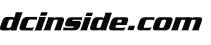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