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의 모항은 선박 수리, 재-보급, 유지관리 및 훈련을 포함하여 해군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군력에 대한 모항 인프라의 중요성은 기지를 매력적인 목표로 만듭니다. 모항의 무력화는 모항에 위치한 군함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작전하는 함대의 작전 수명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항 타격의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진주만 공격으로, 이러한 유형의 공격의 주요 작전적 가치가 어떻게 중요한 전쟁 개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해군은 냉전 동안 소련의 라이벌에 대한 유사한 공격을 고려했습니다. 1977년 당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미국 해군 제독 토마스 헤이워드는 4개 항공모함 전투단으로 구성된 함대를 사용하여 캄차카 반도의 페트로파블롭스크에 있는 소련 태평양 함대 모항을 직접 공격하는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소련 해군 태평양 함대 모항을 무력화하면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련 본토로 더 깊숙이 세력을 투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모항 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 흑해 함대의 크림 반도 모항인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군함과 해군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습은 러시아 해군이 전통적인 모항에서 멀리 떨어진,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덜 개발된 기지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에 비해 훨씬 더 믿을 만한 모항 타격 위협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군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원정적 성격으로 중국 앞마당에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중국 해군 전략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은 첫번째 열도 사슬의 좁은 지형과 중국 해군 모항과 여러 미국 동맹국의 가까운 거리를 처리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모항 공격은 모항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함대를 무력화할 수 있지만, 성공하려면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군 기지는 또한 상당한 방공, 광범위한 센서 범위, 더 많은 표적을 노출시키는 광범위한 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두에 정박한 군함은 방어 능력을 신속하게 활성화하고 정적 위치에서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상태와 무기 탑재량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두 군함이 해군 기지를 보호하는 방공 및 센서 범위를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결합할 수 있다면 모항 공격의 과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해군 기지는 군함 이상의 본거지이며, 종종 상당한 항공 자산도 포함하며, 대체 인프라에 더 빠르게 분산될 수 있습니다. 모항은 또한 공군 기지와 비행장과 가까워서 수많은 항공기가 모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발사될 수 있어 공격을 위한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포격은 주요 해군 기지의 밀집된 방어선을 돌파하고 플랫폼과 인프라에 피해를 입히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타격 그룹은 모항 타격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포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박한 군함 표적의 정적 특성은 또한 활용할 수 있는 화력의 범위를 넓힙니다.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은 부두에서 군함을 격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이동식 군함 표적은 적합한 무기를 대함 미사일로 제한하여 지상 공격 미사일에 비해 더 복잡한 추적기와 킬체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을 배치했지만 진정한 장거리 대함 미사일은 소수에 불과한 미국 해군의 경우, 모항 타격은 장거리에서 적 해군을 격침시키는 몇 안 되는 좋은 옵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지상 공격 포격에 집중하면 미국 해군이 수많은 수상 군함과 잠수함을 포함하여 모항 타격에 적용할 수 있는 전력 구조의 양도 넓어집니다. 비교해보면 대함 미사일 공격은 항공모함을 불균형적으로 포함하고 해군이 가장 잃을 여유가 없는 주요 함선 플랫폼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해군의 대함 화력의 항공모함 중심 설계는 모항 타격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해군은 더 어려운 해상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해 항공모함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군이 모항지 타격을 수행하려면 해상 거부 세력을 무력화하거나 우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해군은 노르웨이 피오르드의 복잡한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련의 항공 해상 순찰대의 감시를 좌절시키고 소련 북부 함대의 모항지가 있는 콜라 반도에 대한 공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진주만 공격을 위해 일본 해군은 해군의 인식된 위치를 오도하고 기습 요소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매우 정교한 기만 계획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의 미국 해군은 냉전의 전임자로부터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항공모함 타격대가 경쟁 해군 기지와 가까운 동맹 해안 지형에서 작전할 수 있다면, 모항 타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상 기반 전력을 활용하여 생존성, 화력 및 탐지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안 지형과 높은 지형은 적의 레이더 감시와 적대적인 대함 미사일 추적기가 킬체인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 개의 중요한 중국 해군 기지는 일본 본토인 규슈의 해상 지형에서 작전하는 미국 해군에 의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Figure 1은 중국의 3개 주요 함대의 모항, 동맹 및 미국 군사 기지, 동맹 해안 지형에서 작전할 때 항공모함 타격대의 도달 반경을 강조합니다.

Figure 1. The strike radius of a carrier strike group operating near the Japanese island of Kyushu and the Philippine island of Luzon, overlayed on the location of key Chinese Navy homeports. (Author graphic overlay)
이 Figure는 MQ-25A 무인 공중 급유 탱커의 배치를 고려한 것으로, 이는 모항 타격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항공단의 범위를 확장할 것입니다. 유사한 지원은 또한 육지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미국 및 동맹군 공군이 운영하는 탱커 항공기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모항 타격에 특히 적합할 수 있으며, 목표물에 대한 근접성은 탐지 가능한 병력보다 낮은 비용으로 모항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습 요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해군은 또한 동맹군 기지에 대한 모항 타격 위협이 유연성을 제한하는 전투와 자세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순항 미사일 외에도 스텔스 항공기도 모항 타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F-35 및 B-21과 같은 스텔스 항공기는 이론적으로 비스텔스 항공기보다 모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플랫폼 당 더 많은 화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각 몇 개의 값비싼 순항 미사일만 발사할 수 있는 비-스텔스 항공기에 의존하는 대신, 스텔스 항공기는 소구경 폭탄이나 JDAM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근거리에서 몇 배 더 많은 무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화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스텔스 항공기는 군대가 해군 기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밀집된 방공망을 돌파하는 어려운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모항 타격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항공모함 항공단의 전투 반경을 늘리기 위해 MQ-25A 무인 공중 급유기를 배치하고, 항공단 내에서 배치된 스텔스 전투기(예: F-35C)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항공단에서 배치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려야 합니다. 미 항공모함 항공단은 장거리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이 거의 없는데, 이는 재고에 더 많은 JASSM을 추가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Spear 3 미사일은 작은 탑재량과 장거리의 유용한 조합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통해 스텔스 항공기의 작전적 유연성과 생존성이 향상되고 방공 우산 너머의 대치 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대량의 화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모항 타격은 여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화재를 통합하는 공동 임무로 구상되어야 합니다. 미 공군, 육군 및 해병대는 모항 타격에 대한 옵션을 개선할 순항 미사일 재고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첫번째 섬 사슬에서 작전하는 대체 병력은 중국의 해군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데 특히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수백 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조달하는 방식과 같이 동맹국도 임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군 병력과 동맹국에서 순항 미사일 무기가 확산되면 모항 타격에 대한 옵션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강력한 미사일 무기고도 더욱 유능해지고 있으며, 스스로 모항 타격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항 타격은 오랫동안 해군 전쟁에서 결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작전적 유용성은 매우 확대되는 의미에 의해 완화되어야 합니다. 홈포트 타격은 해상 갈등을 바다에서 해안으로 확대하고, 표적 국가의 영토에 직접 주요 사상자를 입힐 수 있습니다. 국가들이 모항 타격에 대한 옵션을 고려할 때, 확대 가능성이 가능한 작전적 이득을 능가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쟁이 장기 갈등으로 격화되면 그 이득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June 24, 2024
https://cimsec.org/homeport-strike-a-decisive-tactic-in-fleet-warfare/
현재 미 해군은 니미츠급 10척과 포드급 1척을 운영 중임. 2025년에 포드급 2번함 케네디가 취역하면 2026년에 니미츠 1번함이 퇴역하여 항모 11척을 운영함
2029년에 엔터프라이즈가 취역하는데, 초기 계획에 따르면 아이젠하워는 엔터프라이즈의 취역 후 퇴역이었지만 현재 계획이 바뀌어서 아이젠하워는 2030년대 초반까지 운용될 것임. 이에 따라 니미츠급 2번함부터 10번함까지 9척이, 포드급 1번함부터 3번함까지 3척이 총 12척의 항모가 2029년부터 함대에서 운용될 계획임. 12척의 항모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2032년 포드급 4번함 도리스 밀러가 함대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젠하워는 퇴역하지 않을 전망임
결론적으로 2029년부터 미 해군의 항모 전력은 현행 11척에서 12척으로 증강될 예정임. 미 해군은 2020년대 후반에 총력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단기간 항모 운용 숫자 급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알레이버크 Flight 1의 DDG-51 부터 DDG-71까지의 목록 중 수명 연장이 제외된 함정은 DDG-59와 DDG-62임
이 두척은 1995년에 취역했음. 수명 연장 작업을 받지 않은 알레이버크 Flight 1의 서비스 수명은 35년이므로, 2030년에 퇴역이 예상됨
따라서 양안전쟁 확률이 가장 높은 2020년대 후반까지, 즉 2029년까지 단 한척의 알레이버크도 퇴역하지 않을 전망임
현재 미 해군에 취역한 알레이버크는 2024년 3월 기준 73척임
따라서 FY2029까지 알레이버크 함대는 순증분이 될 것이며, 연간 2척씩 취역이 된다고 가정하면 FY2029에 83척, 연간 3척씩 취역이 된다고 가정하면 88척이 될 것임.
FY2024 기준 타이콘데로가 포함 미 해군 대형 수상 전투함 전력이 87척인 것을 감안하면, 줌왈트 3척을 포함할 시 연간 2척씩 취역하는 상황이더라도 현재의 대형 수상 전투함 숫자를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임
ranchetti in the NAVPLAN set a goal of 80 percent readiness across platforms to be prepared for a conflict with China. Pitts said the emphasis in recent years placed on aircraft readiness has seen it improve from “50-60 percent … to now more than 80,” hitting the target for “combat surge” by improving maintenance.
The NAVPLAN reads: “we will only accomplish this by getting platforms in and out of maintenance on time; in addition, we must embrace novel approaches to training, manning, modernization, and sustainment to ready the force. By 2027, we will achieve and sustain an 80 percent combat surge-ready posture for ships, submarines and aircraft.”
NAVPLAN의 프란체티는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플랫폼 전체에서 80%의 준비 상태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Pitts는 최근 몇 년 동안 항공기 준비 상태에 중점을 두면서 "50-60%에서 현재 80% 이상으로" 개선되었으며, 유지 관리를 개선하여 "전투 급증"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NAVPLAN에는 "우리는 플랫폼을 제때 정비하는 것 만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군대를 준비 시키기 위해 훈련, 인력 배치, 현대화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2027년까지 우리는 함선, 잠수함 및 항공기에 대한 80%의 전투 급증 준비 태세를 달성하고 유지할 것입니다."라 적혀 있습니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4137894
중국의 A2AD 및 해양 거부 전력은 냉전의 종식 이후 기만과 은엄폐를 잊은 미 해군에게 큰 위협이 되었음
이와 같은 위협은 70년대 미 해군에게 똑같이 있었음. 발달하는 소련의 우주 및 공중 기반 감시 자산의 위협은 미 해군 항모 전단이 더 이상 소련의 근해에서 맘대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켰음
이에 대한 미 해군의 대응은 기만과 은엄폐의 부활이었음. 1980년대부터 부활한 공격적인 작계는 대서양에서 미 해군 항모 전단은 공중 기반 레이더 감시 체계에 커다란 음영을 발생시키는 노르웨이 피요르드에 전진배치하여 코 앞에 위치한 소련 북방 함대 모항을 직접 타격하고 항모 항공단 작전 범위 내에 있는 독일 방면 지상군을 지원하는 계획이었음. 태평양에서는 알래스카 일본 하와이 등에 위성 교란 자산을 배치하며 2차 대전 때 실시한 전파 통제로 함대의 위치를 기만하여 소련 태평양 잠수 함대 모항이 있는 캄차가 반도를 항모 함대가 직접 타격하는 계획이었음
비슷한 계획이 최근 부활한 것으로 보임. 맨 윗 사진의 Figure 1과 같이 미해군 항모 함대는 필리핀 루손 섬과 일본 규수 섬 뒤에서 작전을 할 것으로 보임. 필리핀 루손 섬의 시에라 마드레 산맥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서 베일러 만과 라몬 만 등지에 장거리 공중 기반 레이더 감시에 대한 커다란 음영 구역을 만듦. 마찬가지로 일본 규수 섬 또한 남북으로 길게 산맥이 뻗어 있기 때문에 규수와 사쓰마로 둘러싸인 해역에 장거리 공중 기반 레이더 감시에 대한 커다란 음영 구역을 만듦.

미 해병대와 미 육군은 위성 교란을 위해 위성 재밍 및 위성 대즐링 자산을 도입 중임. 위 사진은 한국군이 구축 중인 대 위성 자산으로 레이저로 EO/IR 센서를 교란하고 재머로 레이더 기반 위성 감시를 교란함. 일본 또한 자체적으로 위성 교란 자산을 본토에 확충 중이며 따라서 규수 사쓰마 혼슈에는 대규모 위성 교란 자산이 설치될 것이므로 전시에는 해당 섬에 둘러싸인 해역에 효과적인 위성 감시는 어려워질 예정임. 마찬가지로 루손 섬에도 필리핀군과 미군이 대 위성 교란 자산을 도배 중이며 이는 해당 섬 뒤에서 작전할 항모 함대의 기만과 은엄폐를 도와줄 것으로 보임
크게 루손 섬과 규수 섬 뒤에서 작전할 미 해군 항모 함대는 3가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
1. 중국 해군 모항에 대한 직접 타격
2. 대만 해역에 상륙할 상륙 함대와 호위 함대 타격
3. 대만군에 대한 사전 제압에 나선 중국 공군에 대한 공격적인 요격
이제 역으로 미 해군 항모 함대가 공자의 이점을 누리게 됨. 미 해군은 3가지 작전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대만에 대한 중국군의 위협을 완전히 분쇄할 수 있음. 문제는 중국군이 3가지 타격 작전에 모두 대비할 만큼 충분한 사전 전력 배치가 어렵다는 것임. 규수 섬과 루손 섬 뒤에 집결할 항모 타격단이 5개 정도로 추측하면, 미 해군이 당연히 3가지 작전 중 어떤 것을 강요할 지는 기만과 은엄폐로 중국군이 알 수 없으므로 중국군은 3가지 작전에 대비해 15개 항모 항공단에 대비한 사전 전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윗 정보글에서 미 해군은 2020년대 후반에 일시적인 항모 12척 증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루손 섬과 규수 섬 뒤 해역에 긴급하게 충분한 항모 타격단을 배치하기 위한 전력 증강으로 보임.
그럼 무인 함대는 무엇을 하느냐? 루손 섬과 규수 섬 뒤에서 항모 함대가 작전할 동안 무인 함대는 직접 루손 섬과 규수 섬 앞으로 전진해서 들어감. 무인 함대는 어차피 격침되도 상관 없는 함정이고 애당초 위험 해역에 직접 들어가라고 만든 함대임

일본 F-35B의 뉴타바루 기지 배치 계획은 이러한 미 해군 작전을 크게 뒷받침 할 것임. 일본 자위대의 항모는 미 해군 항모가 공격적인 타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공 작전을 지원하거나 미 해군 항모 함대 MQ-25A의 공중 급유 지원을 받아 같이 작전할 수 있음. 어차피 일본 자위대와 미 해군 함대는 안전 지대인 규수 섬 뒤에 배치될 것이고 해당 함대 항공단의 원활한 작전을 위해 규수 섬 뒤 해역과 바로 이어진 뉴타바루 기지를 F-35를 위한 정비 및 훈련 기지로 쓰는 것이 해당 작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보임.
규수 섬은 일본 자위대에 의해 요새화 되어 있지만, 필리핀은 그렇지 않음. Figure 1 사진에서 보이듯이 루손 섬 뒤에서 작전하는 항모 함대는 대만 전역을 작전 반경으로 두고 있음. 루손 섬이 키포인트인 만큼 미 해병대와 미 육군은 패트리어트, 극초음속, 지대지, 지대함, 대 위성 자산들을 해당 지역에 신속 배치해야 함. 항모 함대는 루손 섬을 보호하고 루손 섬에 배치될 미 해병대와 미 육군은 항모 함대를 보호해야 함.
여기서 중국군은 선택을 강요당하게 됨
1. 규수 섬과 루손 섬 뒤에서 작전하는 항모 함대를 냅두고 대만에 강행 상륙을 한다. 그렇게 되면 상륙 함대는 루손 섬과 규수 섬 해역에서 작전하는 항모 함대라는 전략적 양익 포위에 갇힐 뿐더러, 모항 타격이라는 결정적인 위협에 노출된다.
2. 규수 섬과 루손 섬에 대한 사전 제압에 나선다. 당연히 일본과의 전면전이다.
3. 적어도 루손 섬이라도 사전 제압에 나선다. -> 2번보다는 부담이 많이 덜어지며 어차피 양안전쟁시 필리핀에서의 미군 작전을 상수로 두면 전력이 부실한 필리핀과의 전면전을 1번 대신 선택할 수 있음
여기서 이제 최근 미 육군의 대대적인 개편에 대한 단서가 발견됨. 미 육군의 1 목표는 이제 필리핀 루손 섬 방어로 바뀜. 루손 섬이 넘어가면 대만도 넘어감
정리하면
1. 미 해군 항모 함대는 규수 섬과 루손 섬 뒤에서 작전할 예정이며 대만 방어를 위한 키포인트이다.
2. 미 육군의 1 목표는 이제 필리핀 루손 섬 방어임. 루손 섬 넘어가면 항모 함대의 안전한 작전이 물 건너가고 그럼 대만도 넘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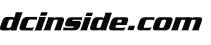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